[공변의 변] 영화 <섹스볼란티어>가 놓인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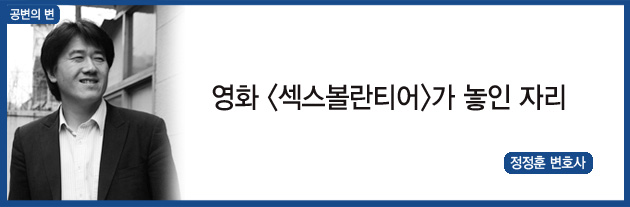
1.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는 전과자와 장애인 여성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영화는 그들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현실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랑’은 ‘강간’으로 규정되고, 영화는 내내 그들의 사랑을 ‘현실’이 아닌 ‘환상’의 공간에서 연출했다.
영화 <오아시스>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나는 그 영화가 불편했다. 영화 <오아시스>는 현실이라는 실재의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길을 탐문하지 않고, ‘환상’이라는 동화적 방식으로 불편한 현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당시 영화 <오아시스>에 대한 나의 느낌은 그랬다.
2.
2010년, 조경덕 감독의 영화 <섹스볼란티어>는 ‘사랑’이 아니라 ‘성’(sex)을 질문한다. 영화를 전공하는 여대생 ‘최예리’는 장애인복지관 천주교 신부의 도움으로 중증장애인 ‘황천길’에게 섹스자원봉사를 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연행되고, 취재를 나온 기자는 그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섹스 자원봉사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대생과 중증장애인 사이의 (자원봉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단죄할 수 있는 법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과 욕망’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상연할 환상의 스크린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제 영화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법정이나 환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안에서 심문한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는 2010년의 영화 <섹스볼란티어>가 놓인 자리가 <오아시스>의 그것보다 반가운 이유였다.
그러나 그 반가움은 그만큼의 아쉬움을 동반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장애인의 성행위 대상으로서 비장애인의 자원봉사’라는 영화적 사건의 설정 자체가 누구의 관점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리고 섹스 자원봉사라는 영화의 질문이 장애인의 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던져진 것인가, 아니면 성을 ‘해소’(처리)하는 방향으로 던져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영화 속에서 취재기자는 여대생 최예리, 천주교 신부, 활동가, 성매매 여성, 거리의 일반인 등 많은 사람에게 ‘섹스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그러나 정작 이 질문은 장애인 당사자를 향하지 않는다. 단 한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기자는 묻는다.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겠느냐”고. 장애인 황천길의 대답은 “배는 고프지 않아요. 사람이 고파요”라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며,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 영화가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록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영화가 생략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현실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겨진다. 정작 당사자들이 성 행위 대상으로서 자원봉사를 요구한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발생하는 윤리적 난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 ‘섹스 자원봉사’라는 문제의식은, 그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줄 수 있다는 일방향적인 권력 프레임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성 실현을 위해서 성의 ‘매매’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방향에서, 성에 대한 도덕주의, 엄숙주의가 뿌리 깊이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매매’가 아닌 ‘봉사’라는 발상으로 섹스 자원봉사라는 우문(愚問)을 폭력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성행위 대상으로서의 자원봉사’라는 질문을 장애인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강요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폭력이다. 또 성의 ‘매매’가 범죄인 상황에서, 성의 ‘봉사’라는 형식으로 장애인만을 특수화하여 ‘구원’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장애인의 성을 끊임없이 객체화하고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 뿐이다. 그런 프레임으로는 봉사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영화 <섹스 발론티어>는 우리에게 장애인의 성(性)이라는 문제를 공적 공간에 펼쳐놓고, ‘사랑’도 ‘매매’도 아닌, ‘제3의 관계’의 가능성을 질문한다. 그러나 그 ‘제3의 관계’가 ‘봉사’라는 한정된 언어와 형식으로 규정되는 한, 그리고 성을 사랑과 매매라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제도적 틀이 뿌리 깊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섹스 자원봉사의 찬반이라는 우문(愚問)으로 변환되어 ‘사랑’과 ‘매매’ 사이에서 진자 운동할 뿐이다.
영화에서 여대생 최예리는 말한다. “흰 표적구에 가깝게 공을 던져야 이기는데 더 이상 표적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다면, 그땐 기준을 바꿔야죠.” 이 말은 그녀가 섹스 자원봉사를 결심한 이유다.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형식은 그 기준을 바꿀 수 없다. 기준을 바꾸려한다면, 표적구를 겨냥하려 한다면, 성에 대한 엄숙주의·도덕주의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성매매에 대한 현실의 태도부터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대한 도덕주의 앞에서 타자화된 성의 발언권은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과 인권은 무시한 채 범죄화라는 편한 규제의 방식을 선택한 도덕주의적 담론이, 장애인의 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라는 담론과 이를 ‘관용’하는 권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영화 <섹스볼란티어>는 역설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3.
섹스 자원봉사의 찬반이라는 우문(愚問)에 대한 영화의 현답(賢答)은, ‘사람이 고프다’는 황천길의 대답이다. 엔딩 크레딧으로 올랐던 차별금지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는 성욕을 ‘해소’(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며, 황천길의 대답이야 말로 이 규정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글_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