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칼럼] 윤씨가 느낀 배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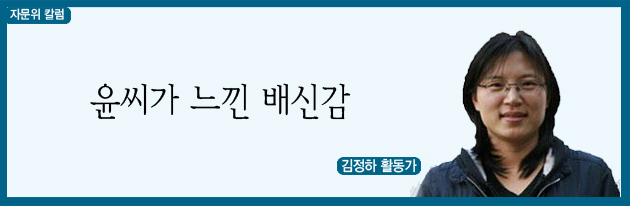
윤씨와 나는 동갑내기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약 5년 전, 음성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배씨의 집에서였다. 배씨와 윤씨는 꽃동네에서 같이 지냈고, 배씨는 윤씨가 용기를 내서 자기와 같이 자립생활을 하길 바랐다. 그래서 윤씨를 서울까지 초대한 것이다. 그러나 윤씨는 망설이고 있던 차였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 당장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살 집이 없는 자기 처지,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한 달에 7만원 나오는 장애수당을 아껴 모아 놓은 몇 십만원, 그리고 가족들은 분명 반대할 터였다. 윤씨에게는 꿈같은 일이었다. 자립하려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 정보도 없는 그에게 시설생활 말고 다른 선택을 하긴 쉽지 않았다. 꽃동네에서도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를 얻거나 상의를 할 수 없었다. 그저 꿈만 꿀 뿐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간간히 전화연락만 하던 차에 윤씨는 뭔가 결심한 듯 전화를 했다. 그동안 꽃동네에 맘 맞는 친구들을 꼬셔서 함께 자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립생활센터를 연결해 달라고 했다. 다행히 그간 활동보조서비스도 좀 확대되어 있었고, 자립생활센터들이 체험홈을 운영하기도 해서 그래도 뭔가 도전해 볼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센터에 연결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었다. 윤씨의 동생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거냐’고 물으며 반대했다. 윤씨는 좌절해야 했다. 맘 맞는 친구들도 각각 가족들의 반대로 시설에서 나오지 못했다. .jpg)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윤씨는 다시 전화를 했다. 이젠 도저히 시설에서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태어나 시설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마침,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시설장애인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노력으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서 자립생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법을 보니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그동안은 장애인을 시설에 “조치”했었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씨와 윤씨의 동료, 몇몇 단체들이 모여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법에는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되었던 권리를 살려보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윤씨는 다시 전화를 했다. 이젠 도저히 시설에서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태어나 시설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마침,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시설장애인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노력으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서 자립생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법을 보니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그동안은 장애인을 시설에 “조치”했었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씨와 윤씨의 동료, 몇몇 단체들이 모여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법에는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되었던 권리를 살려보기로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경신청서를 받은 음성군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는 공문 1장을 달랑 보냈다. 그걸로 끝이었다. 재차 요구하고, 전화를 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설에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요. 늘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가족에게 부담만 주니까…… 시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적응이 되니 능력도 없는 내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모 장애인단체의 여름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다른 장애인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같이 중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온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배신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시설 아닌 곳에서 살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 윤국진씨가 음성군수에게 보낸 편지 중 –
어느 누구는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시설의 ‘보호’를 받으니 좋다고 생각한다. 몇몇 나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봉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약없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시설에 살면서, 주는 밥, 주는 옷을 입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다(31.9%), TV를 본다(19.3%)’고 대답하는 사람들, 전체의 90%이상은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윤씨의 말대로 ‘아무도 나에게 시설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윤씨가 느낀 배신감은 누구에게 느낀 배신감일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 장애인시설. 우리는 이제 그곳의 삶에 대해 이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존재의 정체를 묻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거기에는 누가, 무엇이 있는가. 시설이 보호와 육성의 공간인지, 파괴와 감금의 공간인지를 논하기 전에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자. 시설에 격리된 채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가는 것, 일 년에 한두번 놀이공원에 간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 그 삶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제거된 채, 삶의 모든 색깔이 벗겨진 채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 무색(無色)의 삶은 무엇인가. 조르지오 아감벤(G. Agamsen)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발가벗겨진 삶(barley life), 날 생명(just life)’ 이다. 인간의 삶이 생물학적 생명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다시 말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고, 성장을 하다 또한 쇠약해져가는 ‘그저 생명체’로 축소되는 것이다.
– 고병권, 2009,「탈시설, 그 ‘함께-함’을 사유하기 위하여」-
글_김정하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